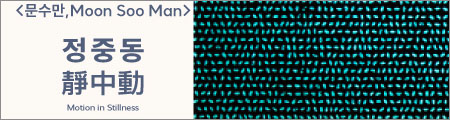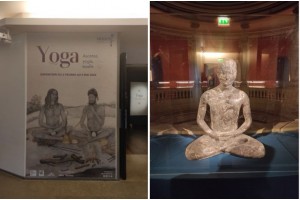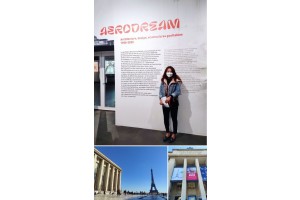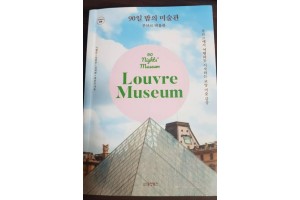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본문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이며, 당대의 거장이다. 40년 넘게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작품으로 관객에게 질문을 던져왔다. 철학자의 풍모가 진하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프랑스인이다. 유대인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던 1941년 어느 밤, 둘은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다툰 다음 아버지는 마루 밑 비밀창고로 숨어들었고, 어머니는 관청에 가출신고를 했다. 볼탕스키가 태어난 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내야 했지만, 어머니는 식구가 모두 살아있음에 안도했다. 그 후 가족은 뭉쳐 다녔고, 12세에 학교를 그만둔 볼탕스키는 주중에는 의사인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주말이면 소설가이자 공산당원인 어머니와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가 예술가로 성장하는 데는 12살 위 형이자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장 엘리, 5살 위 형인 세계적 좌파 사회학자 뤽 볼탕스키의 영향이 한몫한다.
매일 아침 병원에서 그저 세상을 관찰하던 소년 볼탕스키는 어느 날, 대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세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러다 600만명이 됐을 때 그는 중얼거린다. “모두 죽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이 600만명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해하려 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된 후, 전쟁 속 죽음을 넘어 보편적인 죽음이라는 근원으로 들어갔고, 거대한 집단학살이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자 탐구했다.
조각, 사진, 회화, 필름, 설치 등의 작업을 해 온 그는 1958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말 아방가르드 단편영화를 선보이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1970년대 초에는 아르비방(Art Vivant·살아 있는 미술) 그룹과 함께 색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화법을 구사하는 작업을 했다. 구조주의 등 사회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그는 미술관보다 대중의 생활공간에서 미술의 경계를 넓혀갔다. 수집가에게 팔려가는 그림보다는 미술관 작업들을 해왔으며, 기차역이나 버려진 공간에서 전시를 열어 무작위 대중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볼탕스키의 작품은 세계 주요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그는 카셀 도쿠멘타에 세 차례 초대됐고,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 대표작가이기도 했다. 독일의 쿤스트프라이스상(2002)과 카이저 링상(2002), 일본의 프리미엄 임페리얼상(2007), 프랑스의 경계없는 창작가상(2007) 등을 수상했다. (경향신문 인터뷰 발췌)
파리는 이번 주부터 대대적인 파업 사태로 도시가 거의 마비되고 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퐁피두에서 열리는 볼탕스키 전시를 보러 갔는데 집에 올 때는 교통수단이 없어 두시간이나 걸어와 발목까지 아팠다. 하지만 전시의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볼탕스키는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이 느껴졌다. 아마도 유대인인 어머니의 영향과 나치의 대학살이 그의 작품속에 모티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피를 토하며 고통받는 사람의 영상과 그림에서 그런 작가의 의도를 감지했는데 카메라에 담기에는 다소 끔찍스러워 스킵했다.
기법적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빛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칸막이만 열어두고 가서 보면 일종의 그림자쇼를 연출하고 있다,

익명의 수많은 옷들을 통해 삶과 죽음, 지속과 소멸을 표현한 그의 시그니처 작품을 실제 눈앞에서 보니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철학적으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작품이었지만 나는 이 유명한 옷더미작품에서 뭔가 시체들의 무덤같은느낌을 받았다. 모두 다 검은 옷에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에는 이름과 사진이 붙여져 있어 마치 납골당을 연상시켰다.
투명한 천막들에 새겨진 눈들이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눈을 마주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눈에 담긴 수 많은 감정들이 와닿았다. 어떻게 보면 슬프고 어떻게 보면 따뜻함이 담겨 있는 시선들은 나를 한참동안이나 그 곳에 서성이게 했다.

이 작품은 웬지 모르게 자코메티적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팜플렛을 읽어보니 자코메티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멋진 작업들은 안타깝게도 캡션이 하나도 없었는데 설마 퐁피두 큐레이터가 누락했을리는 없고 아마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았다. 사실 컨템퍼러리 아트에서는 캡션이 작품의 감상이나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작가가 붙인 캡션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볼탕스키의 작품세계를 언급한 자료나 그의 인터뷰를 떠올리며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된다고 우기면서 (?) 작품 감상에만 집중했다.
그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기억과 집단기억의 콜라보를 통해 더 깊은 사회적 성찰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고서 작품을 바라보니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시도로 품위있게 표현했기에 볼탕스키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프랑스인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작가라 생각했다.
영상에서 종소리가 나오고 화면 하단에는 풀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풀향기 쫙 퍼져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퐁피두에서 만든 볼탕스키 팜플렛인데 대충 읽어보니 (내맘대로의 번역이라 오역도 있을 수 있음)
볼탕스키는 "작업을 많이 할수록 작가는 점점 사라지고 스스로 작품이 된다며 자기 생각엔 작가의 가장 큰 바람은 작품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결국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작가는 인생의 슬픔과 행복을 잘 활용하라는 메시지 인 것 같다.
작가는 더이상 거리감이 없는 타인과 자신의 열망의 거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한다고도 언급했다. 볼탕스키 본인은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선택했다며 그것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과 닮아 있는데 그 예로 자코메티도 그의 실제 이미지와 닮아 있다며 우리는 시간을 생산하는 것이고 인생의 시간을 만드는 거라는 점을 인터뷰에서 역설했다.
인터뷰 전반에 프랑스 사람 특유의 냉소적인 말투가 흐르고 있음에도 내용적으로는 따뜻함이 전달되었다. 웬지 모르게 한나아렌트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 인터뷰였다고나 할까. 아무튼 시시껄렁한 말장난이나 현학적인 인터뷰가 아닌 인생의 깊이와 관조가 담긴 대가의 철학을 오롯이 담은 인터뷰라 생각했다.
나오는 길에 기념품샵에 진열된 볼탕스키와 베이컨의 엽서들이 멋지다...심지어 베이컨의 그로테스크함도 작은 엽서로 제작되니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임...어쩌면 인생도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하나 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괴로운 것과 같은 이치일까!
비와 추위, 파업이라는 3중고의 역경(?)을 뚫고 만나고 온 볼탕스키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왜 프랑스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로 불리는지를 알게 된 전시였다. 내년 3월까지라니 퐁피두 관람객들에게 꼭 다녀갈 것을 강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