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윤 개인전 《딸기의 장소》

본문
어깨를 맞대고 바라보는 곳
글 나가람
이전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그림들은 제 3자를 어떤 기억과 풍경으로 이끄는 듯 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 보이는 그림들은 보다 친밀하고, 사적이며 가까운 거리감으로 다가온다. 첫 인상은 이러하다: 사적이면 서 뒤로 물러나 있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그림. 차분한 색과 겹겹이 쌓이는 붓질 사이로 담담하지만 집 요한 빛이 비집고 들어오는 그림. 우지윤의 그림은 존재하는 풍경을 한아름 안아다가 손 마디가 불거지 도록 몇 번이고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 꺼낸 듯한 인상이다. 거칠게 툭 튀어나온 나무의 가지나 빛에 관 통 당한 유리창의 가장자리도 퍽 부드럽게만 보이는 풍경이 이어진다.
감정에 대한 기억일지라도 개인이 경험한 순간은 각자 그대로 고유하다. 상실, 은은한 고독, 감사 함, 따스함, 애정과 같은 감각과 감정들은 한데 섞여 그만의 특수한 배합으로 펼쳐지기 마련이다. 고요 한 가운데서 느껴지는 시간에 대한 야속함, 찬란하게 빛이 나 언제라도 깨져버릴 지 모른다는 작은 불 안감, 안온한 호젓함. 그런 매일의 감정들은 일순간 불쑥 솟아 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임에도 강렬하고, 동 시에 무척이나 연약해 어느새 손끝으로 미끄러져 내리곤 한다. 우지윤의 그림은 이런 순간들은 대변한 다. 형용하기 어려운 시간대, 불분명한 사물의 가장자리는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기억의 불영속성을 표현 해낸 듯 하다.

우지윤, 작은구름, 2023, oil on canvas, 130.3x97. © 작가, 눈 컨템포러리

우지윤, 시-도, 2024, oil on cnavas, 33.4x21.2. © 작가, 눈 컨템포러리

우지윤, 늘, 2024, oil on canvas, 91x116.8. © 작가, 눈 컨템포러리

우지윤, 난의품, 2024, oil on canvas, 145.5x112.1. © 작가, 눈 컨템포러리

우지윤, 스물여덟번의 계절, 2024, oil on canvas, 33.4x53. © 작가, 눈 컨템포러리
꿈과 현실을 직조하기
우지윤이 바라보는 풍경은 꿈과 같은 산발적인 생각들과 스스로 발 딛고 선 현실 사이를 오간다. 형용 할 수 없는 꿈들을 현실의 캔버스 위에 안료와 붓으로 연거푸 그려낸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양쪽을 거머쥐려는 노력은 이렇게 반복된다. 이를 무용하되 아름답다 칭하고 말 것인가? 그가 그려내려는 화면 안의 이야기를 더 들여다본다.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의 작품들은 결국 현재를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렇듯 우지윤은 현재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낸다는 것은 지금의 감각과 감정에 치열하게 매달리는 일이다. 온도, 작은 소리, 촉감과 향기, 어디선가 휘 불어오는 바람. 이런 것들을 가 만히 바라보면서 동시에 불안, 기쁨, 약간의 아쉬움, 조급함, 감사함과 같은 파동들을 세세히 살피는 일 이다. 이는 생각보다 무척 버거운 일이기도 하다. 잠시 고개를 들고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자. 지금 나를 둘러싼 것들은 나보다 크고, 나를 압도하며 그를 나라는 공간에 붙들어 놓는 것은 어지러울 정도로 힘 든 일임을 금세 깨닫게 된다. 우지윤은 이런 힘든 일을 꾸준히 한다. 마치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려 는 보디빌더처럼, 한 자의 글이라도 더 써 내려가려는 작가처럼, 그녀는 꾸준하고 집요하게 순간을 반복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는 모두 상이하여, 우지윤이 써 내려간 간절한 편지는 우리에게 영영 닿지 못할지 도 모른다. 내가 서 있는 곳과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다르듯이, 우리의 풍경은 서로 다르고 서로를 이해 하려는 노력은 곧 한계를 맞이한다. 이렇듯 각기 다른 서로의 풍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낸 순간을 당신이 살아낼 수 있을까? 우지윤의 그림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에 꾸준히 다가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당신의 신발에 나의 발을 넣어보는 일. 이렇듯 무용하고 인간적인 행위가 또 있을까.
끌어안기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지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를 그의 화면으로 이끄는 대신 우리의 곁 혹은 뒤에 서서 가만히 자신의 풍경을 풀어내 보인다. 매 일 기도와도 같이 쌓아 올린 이 작품은 반복적이고 수행적이다. 화면 속 풍경을 바꾸기 위하여 붓이 움 직이는 것이 아니라, 붓의 움직임이 쌓여 화면이 변화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성실하게 쌓여가는 이야기 속에는 당신을 향한 다정함이 녹아 있다. 그녀가 한 겹 한 겹 소중히 쌓아 올린 이 풍경은 자신만을 위 한 것이 아니다. 이 풍경을 우리의 것이라고 불러보자. 이제 그림이 사뭇 다르게 보일 것이다.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들이 끔찍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위기를 맞이한다.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성취 와 역사, 즉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설명하곤 한다. 영광의 순간은 후광이 되기도 하지만, 상실의 순 간은 낙인이 되기도 한다. 밝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나라는 사람을 직조해 낸다. 이미 일어난 일을 뒤틀어 낼 수는 없지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가능하다. 과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인정하며, 현재의 나를 위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과도 같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과거를 외면하고 이를 왜곡하여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여기 한 여성이 있다(1). 그녀는 학대하는 가정과 억압받는 일련의 공동체로부터 탈주한 사람이다. 그녀 는 화려한 색감의 자신의 옷을 가리키며, "이는 절대 허용 받지 못하죠"라고 말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치마 밑단은 2인치가 짧고, 어깨의 진동선은 화려하고, 이런 스티치는 너무 과시적이라고 말한다. 화려 한 옷감이라는 점 외에는 눈에 띄는 구석 하나 없는 단순한 자신의 드레스를 이리저리 꼬집어내며, 이 런 세세한 부분을 차근히 설명하는 그녀의 눈에는 어떤 평화가 깃들어 있다.
과거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현재의 자신이 허락함으로써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를 한 듯 하 다. 완전히 다른 현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감싸 안은 자신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단단하고 고요한 그녀의 눈길 끝에는 자신의 것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입 밖에 내놓기 힘든 슬픔들이 가득하다. '내재적으로'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상처를 준 과거 일체를 '내재적으로' 소화해 버린 듯 하다.
편견과 비교는 우리를 서로의 고유함으로부터 밀어낸다. 그녀는 편견에 가득 찬 시선을 받으면서도, 자 신의 경험은 고유하며 당신의 경험 역시 그러하다고 말한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자꾸만 과거가 되어버리는 현재를 끊임없이 긍정하며, 매 순간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그녀의 존재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나의 이야기가 곧 당신의 이야기이고, 당신의 이야기 역 시 나의 것이 될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우지윤의 그림을 바라 보자. 이것은 분명 사적인 풍경이다. 그녀가 바라보고 겪은 작고 큰 감정과 경험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당신에게 호소하는 이 그림은 외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당신이 여기에 자신을 풀 어놓는 동안, 너와 나 사이의 경계는 느슨해진다.
나란히 그리고 가만히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내달렸던 첫 개인전의 그림들과는 달리,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풍경들은 꿈과 현실 그리고 의지와 좌절 사이에서 건져낸 빛나는 풍경으로 채워졌다. 달아나지 않으며, 외면하지도 않 고 그저 끌어안아 낸 풍경 속에는 작고 큰 반짝임이 가득하다. 그녀의 말처럼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 고 있는지도 모를”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이런 시대를 굳건히 건너가는 우리는 미리 재단하지 않으 며, 샘내지 않고 그저 존재를 가만히 껴안고자 한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풍경은 부드럽지만 강인하 다. 존재했고 겪어낸 시간을 담아낸 그림을 바라본다.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한 우리는 함께 온전하다. 내 일 다시 이 감각이 멀어질지라도, 지금 마주한 순간은 우리보다 큰 현재를 품고 있다
ⓒ 아트앤컬쳐 - 문화예술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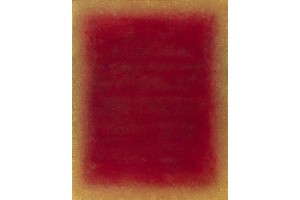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