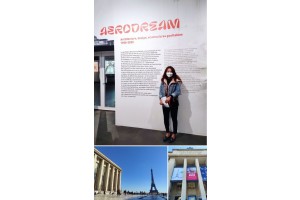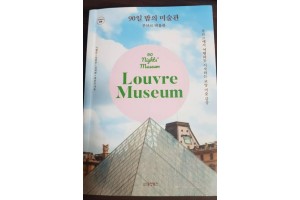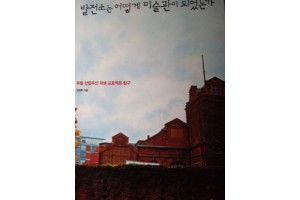퐁피두 <선사시대> 전
본문
선사 시대 예술은 매혹스러운 대상일 뿐 아니라 모든 예술적 실험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이 되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사로 잡혀 있던 피카소, 세잔, 에른스트, 요제프 보이스, 이브 클라인, 루이스 부르주아, 주세페 페노네 등의 20세기 작가들이 마들렌의 맘모스, 레스퓌그의 비너스 등 구, 신석기 시대의 상징적인 작품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이 전시의 컨셉이다.
‘19세기 화석 분석을 통한 지구 생명의 오랜 시간에 대한 인식’, ‘1860년대 선사시대 기술과 예술의 출현으로 당시 고대 인간에 대한 이해’, ‘20세기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장식적 동굴벽화의 발견’ 으로 구성된 전시는 선사시대와 근현대 예술를 연결시키고 있다. (서울아트가이드 기사에서 발췌)
<선사시대 /모던 애니그마 > 라는 제목의 전시라니! 컨템퍼러리 아트를 주로 취급(?)하는 퐁피두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마치 자연사 박물관이나 이집트 유물 특별전 같은 느낌을 주는 전시 제목때문에 살짝 당황스러웠다.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게 된 흔적들이 결국 현대 미술로 까지 이어졌으며 현대 작가들이 선사시대를 오마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전시일거 같았는데 과연 그 연결 고리를 어떻게 이어갈 지 무척 궁금했다.
돌로 만든 이 여자 조각상은 구석기 시대에 제작되었다는데 1920년대 아방가르드 아트매거진에서 리메이크 되고 훗날 피카소와 자코메티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자코메티의 드로잉은 처음 본 것 같다. 무지막지 하게 큰 발로 앙상한 몸을 받치고 있는 조각상도 다 이런 드로잉을 거치고 거치면서 완성되었던 것이다.
라스코동굴 벽화속의 손자국을 연상시키는 작품도 있었다. 대지미술을 구현하는 리차드 롱의 작품이 선사시대 인간을 탐구한 결과로 탄생했다니 참으로 흥미롭다.
폴 세잔의 작품들도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장 드뷔페와 이브 클랭의 대작을 본 것이다.
20세기 미술사에 피카소 만큼이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장드뷔페..."그림은 아름다워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작가이다. 아르브뤼(ART BRUT/가공되지 않은 즉흥적이고 생명력있는 그림) 로 설명되는 그의 작품은 어린아이나 정신병자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초등학교때 리움미술관에서도 이 두 작가의 작품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작가들인지 당연히 알지 못했었다.
바디아트를 구현하면서 훗날 팝아트와 미니멀리즘에 영향을 준 이브클랭의 푸른색 (이브클랭블루 IBK)이 발길을 멈추게 했다. 붓이 아닌 여성의 나체에 물감을 입혀 캔버스에 뒹굴게 해서 나타나는 비의도적 인체표현 방식은 1950~60년대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시도였을 것 같다. 미술사의 큰 획을 긋는 작가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과감한 실험정신이 아닐까 한다.
이번 전시는 어쩌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다소 엉뚱한 발상과 상상력이 관람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처럼 수많은 작품과 작가들을 어떠한 주제로 엮어내고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 전시의 퀄리티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