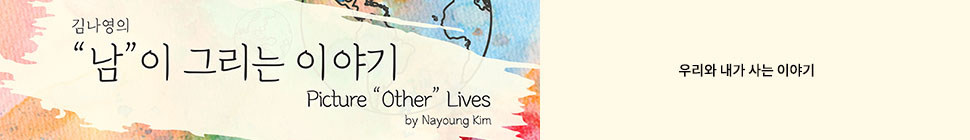"똥칠 한 번 해 볼게요," 탈라 마다니(Tala Madani)
-
154회 연결
-
- 관련링크 : https://prismaticreader.com/172회 연결
본문
더러운데 늘 있는 일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아기를 출산할 때 아기와 함께 다른 것도 나온다는 것.
아기도 내보내고, 똥도 내보내는 거예요. 아기를 몸 밖으로 밀어낼 때와 똥을 밀어낼 때 쓰는 근육이 같거든요.
참, 그렇죠.
저는 임신 34주차에 어느 임신, 출산 콘텐츠 유튜버로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산전우울증 때문에 하루에 15시간은 머리가 흐릿했는데, 그 순간은 정신이 베일 듯 또렷해지더라고요.
“와, 하다하다 이제 똥칠까지 하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했던 임산부는 물론 저뿐만 아니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더러운 꼴’ 보일까 걱정하는 예비 엄마들을 위한 팁이 있더라고요. ‘괜찮다,’ ‘분만실 간호사 분들은 이에 익숙하다’라는 다독임부터 시작해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써서 관장을 하면 된다’라는 현실적인 대처 방법까지. 임신 중에 나타나는 웃기는 변화들이(이를테면 방귀가 그렇게 자주 나온다든가 생전 당기지도 않던 던킨 도넛 글레이즈드가 그렇게 아른거린다든가) 막상 겪으면 가벼운 해프닝이 아니잖아요. 아기 낳으면서 똥칠할 가능성도 예비 맘의 깜찍한 걱정 정도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많은 임산부들을 생각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우습게 무시무시한 생리 현상이더라고요.
아기가 처음으로 자궁을 투과하지 않은 빛을 받는 순간을 깨끗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두려움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다리 사이를 집중적으로 비추는 병원 조명 아래서, 똥칠하기 싫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요.
물론 힘을 줄 때는 그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완전무결한 모습으로 엄마가 되는 경우보다 똥칠하면서 엄마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똥칠한 엄마 (디스코 베이비)』 (Shitmom (Disco Babies)), 탈라 마다니, 2019 (출처: David Kordansky Gallery)
『똥칠한 엄마』 (Shitmom). 오일 페인팅과 수동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드는 탈라 마다니(Tala Madani)가 이어온 시리즈 제목입니다. “Shit mom”은 속어로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하는 엄마,’ ‘개엄마’쯤 되겠네요. 동시에 “shit”은 똥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다니의 똥칠한 엄마들은 “shit mom”을 곧이곧대로 체화하는 셈이예요. 어떤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유머는 시시하고 납작한 ‘아재 개그’가 되기 쉬운데, 마다니의 유머는 시시하지 않아요. 눈에서도, 머리에서도 저 뭉클한 오물색으로 꿈틀거리는 엄마들의 우스꽝스러운 형상이 좀처럼 잊히지 않거든요. 심지어 엄마가 똥이 된 걸로도 모자라 그 가장 더러운 모습이 몸에 꽂히듯 쏘이는 디스코 조명 아래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는 그 유머가 잔인할 정도로 진지하게 느껴져요. 분만실 조명 아래에서 똥칠하며 온 힘을 소진하는 엄마들이 떠올라서요. 웃긴데 그냥 웃긴 건 아니고, 위가 묵직하게 웃기다고 할까요.
저에게 출산은 제 몸이 온갖 체액으로 가득한 살덩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경험보다 가깝고 너저분하게 각인한 일이었어요. 그 사실이 딱히 좋거나 싫다는 건 아니예요. 그건 단지 엄마라는 몸이 얼마나 끈적하고, 흐물흐물하고, 채 닦이지 않는 흔적을 몸 안팎에 남길 수 있는지 깨달은 계기였어요.
그래서인지 마다니의 캔버스 위에서 지저분하게 흐르다가 얼추 굳어진 갈색 물감 덩어리가 막 아기를 낳은 엄마의 몸의 굳기, 그 몸 위에 겹쳐 흐르는 온갖 끈끈한 액체, 그리고 그 액체를 뒤집어쓴 채 엄마와 아직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아기와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기가 나온 직후에 젤라틴처럼 흐물거리는 배를 보면서 엄마라는 몸은 본질적으로 날아갈 듯 우아하고 가벼울 수가 없구나, 생각했죠.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Immaculate Conception), 귀도 레니(Guido Reni), 1627,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뉴욕)
(출처: Lawrence OP Flickr)
마다니도 ‘깨끗하게’ 잉태하고 엄마가 된 마리아의 저 구름처럼 가벼운 몸을 아주 조금은 동경했던 걸까요. 폭력적인 디스코 조명을 『똥칠한 엄마 (꿈꾸는 기수들)』에서 동심 낭낭한 파스텔 색 구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보면요.
『똥칠한 엄마 (꿈꾸는 기수들)』 (Shitmom (Dream Riders)), 탈라 마다니, 2019 (출처: David Kordansky Gallery)
물컹거리는 엄마의 몸처럼 두꺼운 물감 덩어리로 이루어진 아기는 엄마 등이 꺼지는 줄도 모르고 말을 타요. 엄마가 한 무릎, 두 무릎 내딛을 때마다 엄마 몸은(똥은) 아기 몸에, 엄마가 움직인 자리에 묻어나고요. 캔버스를 만지면 손끝에도 꾸덕하게 묻어나올 듯한 이 살덩어리 뒤에, 손에 쥘 수 없는 화사한 구름이 피어올라요. 바람이 구름의 모양을 계속 바꾸듯, 캔버스 속 구름도 그 형태가 연기가 흘러가듯 바뀔 것 같고요. 둥그렇게 떨어진 갈색 물감 덩어리의 테두리에 갇힌 엄마의 몸과는 대조적이죠.
한편 파스텔 핑크, 베이비 블루, 레몬, 에메랄드는 “꿈꾸는”(dream) 아이의 세계를 전형적으로 상징하는 색이기도 해요. 작품의 제목이 “꿈꾸는 기수들”인 걸 생각하면 마다니도 아마 이 고정관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테고요. 그렇다면 저 달달한 구름은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며 ‘개고생’하는 엄마와 마냥 신난 아기들의 발랄한 세계를 대조하는 풍자의 일환일까요?
글쎄요. 『똥칠한 엄마』 시리즈에 포함된, 똥칠한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 심플한 풍자가 마다니의 메시지의 전부는 아닌 듯해요.
(왼쪽, 오른쪽) 『혼자』(A Solo), 2019; 『유령돌보미 #3』(Ghost Sitter #3), 2019, 탈라 마다니
(출처: David Kordansky Gallery)
사방에 흔적을 남기던 엄마의 살덩이는 『혼자』와 『유령돌보미』에서 문자 그대로 형체가 사라져요. 똥칠한 엄마가 구름 같은 가벼움을 원했다면, 이 두 작품에서 엄마는 어쩌면 너무 가벼워지죠. 마치 빨랫감을 들어올리는 바람처럼, 그곳에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혼자』에서 지친 몸짓으로 앉아 있는 엄마도 아기를 돌보던 ‘개고생’의 흔적만 캔버스 오른쪽 아래에 거무스름한 물감 자국으로 남긴 채 뿌옇게 사라져요. ‘아이돌보미(babysitter)’란 말은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독립적 궤도를 지니는 대신 아이를 위성처럼 맴도는 존재가 되는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마다니는 ‘아이돌보미’를 ‘유령돌보미’로 슬쩍 바꾸면서 ‘똥칠한 엄마/개엄마(shitmom)’와 같은 노골적이면서도 서늘한 유머를 보여줘요. 돌봄 노동이 엄마 몸을 부수고 엄마의 모든 움직임을 아이의 움직임에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엄마라는 사람은 없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유령’처럼. 아마도 ‘아이돌보미’보단 ‘유령돌보미/앉아있는 유령(ghostsitter/ghost sitter)’이 현실을 더 정확히 설명한다는 뜻일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몸이 유령처럼 사라지는 게 적어도 마다니의 작품에서는 마냥 우울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똥칠한 엄마(디스코 베이비)』에서 엄마의 지저분한 살을 고스란히 드러내던 디스코 조명의 폭력적 시선을 한 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시선에 붙잡히느니 몸뚱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형체가 없는 바람이 단단한 몸을 잃은 사람을 처연하게 비유하면서도, 정지해 있던 것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요.
『자연 예술 (침대 시트)』(Earth Work (Sheet)), 탈라 마다니, 2019 (출처: David Kordansky Gallery)
『똥칠한 엄마(꿈꾸는 기수들)』 뒤편에서 피어오르던 과도하게 화사한 구름은 『자연 예술 (침대 시트)』에서 조금 차분해져요. 갈색 살덩이와 달달한 불량식품 같은 배경의 윽 소리 나던 대조도 사라지고요. 마구 흩어지던 엄마의 몸뚱이도, 『혼자』에 물감 자국으로 남아있던 돌봄 노동의 흔적도 사라진 이 해질녘에서 느껴지는 건 가벼움이예요. 똥칠하지 않은 하얀 침대 시트와 그 시트를 들어올리는 바람.
물론, 깨끗하다 못해 창백해 보이는 시트의 하얀색은 살의 온기를 잃은 유령을 떠올리게 하기도 해요. 돌봄과 가사 노동이 다시 시작될 내일 아침이면 이 흰 시트는 또 얼룩질 수도 있을 거고요.
Tala Madani, Shitmom Animation, 2021, 303 Gallery (영상 출처: "Artist in New York City" YouTube channel)
하지만 내일 시트에 다시 똥칠하게 될 것이란 평범한 사실이 지금 해질녘에 훅 불어오는 바람과 아직 하얀 시트의 가뿐함을 소중하게 만들어요. ‘유령돌보미’가 되며 몸뚱이가 흐물어져 사라지는 과정은 공허하지만 뜻밖의 자유로움을 안고 오기도 하는 거죠.
마다니는 “내 작품이 내가 이란 출신이란 사실과 묶여 해석되는 데에 저항해 왔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마다니의 이런 입장은 출생지를 비롯한 모든 정체성에도 적용되고요. “아티스트의 작품은 물론 그 개인의 삶과 내밀하게 엮여야 하지만, 그 관계는 ‘작품 안’에서 드러나야 해요. 아티스트 본인이 아니라요.” 이게 제가 마다니의 출생지,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마다니 역시 아이를 가진 엄마라는 점을 일찍이 밝히지 않은 이유예요. 물론 이렇게 말함으로써 저는 작품 속 똥칠한 엄마들을 결국 마다니의 정체성에 귀속시키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다니의 똥칠한 엄마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엄마들을 흔들고 웃게 한다면, 그건 마다니가 단지 엄마이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건 흔하지만 좀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엄마가 되는 시작점이 캔버스 위에 ‘문자 그대로’ 펼쳐지기 때문일 거예요.
“똥칠 한 번 해 볼게요. 뭔지 알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