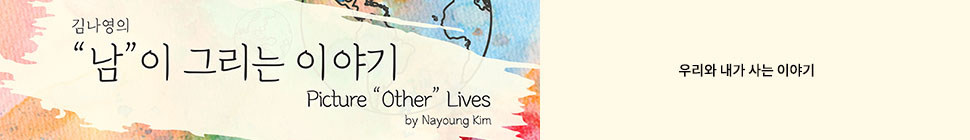섬세한 밤의 생명체, 마르셀 드자마(Marcel Dzama)
-
140회 연결
-
- 관련링크 : https://prismaticreader.com/180회 연결
본문

새로운 아티스트를 만나게 되는 계기는 그 사람의 작품인 경우가 많죠. 저 역시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새로운 창의력과 마주칠 기대로 핀터레스트를 누비는 많은 사용자 중 하나예요. 피드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품을 통해서 그 아티스트와 말을 트고,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이야기를 듣죠. 아티스트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요. 작품들을 따라가면서 제법 긴 대화를 나눴지만 아티스트의 얼굴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티스트 마르셀 드자마는 예외였어요. 수채화, 영상, 무대 장식, 모형(diorama)을 아우르는 그의 작품을 만나기 전에 그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브룩클린 스튜디오에서 마르셀 드자마, 2021 (출처: 제이슨 슈미트,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
“카메라 켜져 있을 때는 할 줄 아는 것만 해요.” 제가 처음 만난 드자마는 자신이 연필로 스케치하고 있는 작품을 비추는 카메라를 향해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역시 쑥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가까이 데이비드 즈워너(David Zwirner) 갤러리에서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중견 작가지만, 10분 남짓한 인터뷰 내내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흰 여백으로 채워진, 그가 자란 캐나다 북부 위니펙(Winnipeg)의 겨울 풍경과 낭만주의 시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의 이미지들이 그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눈 주위에 서글서글한 웃음 주름이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섬세한 감정과 천진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얼굴에서 보이는 그런 주름.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작품이 직설적인 통찰과 짓궂은 리듬감을 대담하면서도 단단하게 엮어내고 있었어요. 그가 풍기던 부드러운 예민함은 뜻밖에도 야무진 조직을 지니고 있었죠.

『낭만주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마르셀 드자마, 2009 (출처: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

『공기 중의 영혼들은 혁명의 냄새로 연명한다』, 마르셀 드자마, 2018 (출처: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

(왼쪽, 오른쪽) 『우리 아빠는 야수였고, 엄마는 미녀였고, 할아버지는 흡혈귀였다』, 마르셀 드자마, 2021;
『4명의 성인 모두가 우리의 물 웅덩이를 축성했다 (그리고 손잡고 해변으로 걸어갔다)』, 마르셀 드자마, 2021 (출처: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
드자마는 중세 동화에서 볼 듯한 환상적 존재들과 가면무도회에 참석한 듯한 사람들을 캔버스에 배열해요. 조금 의뭉스러운 표정을 짓는 달, 물방울 무늬 레오타드를 입고 관능적인 가면을 쓴 무용수와 기수들, 박쥐, 곰, 그리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애매한 생명체들이 화면 가득 군무를 추죠. 금가루가 섞인 듯한 겨자색과 짙은 바다 같은 푸른색이 망설임 없이 대조를 이루면서 휘황찬란한 서커스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요.
온갖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 장난스러우면서도 서늘하게 모인 드자마의 캔버스는 나뭇가지를 꺾거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당기는 행동이 잔인하다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의 거침없고 혼란스러운 상상력을 떠올리게 하기도 해요. 총과 잘린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들고 우아한 발레 동작을 취하는 무용수와 동물들, 어른들에게는 백인우월주의의 잔혹한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원뿔형 모자를 쓰고 망토를 두른 한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이 생명체들은 어른들의 팍팍한 질서가 잠드는 밤에 풀려나요. 피터팬과 웬디가 만나는 시간도 낮이 아니라 웬디의 부모님이 잠든 밤이었죠. 그래서 드자마의 작품은 동화와 신화 속 우주를 누비는 아이의 다채로운 상상력과 폭력이 꿰뚫은 어른의 시꺼먼 역사가 기묘하게 섞인다는 평을 듣곤 해요.
드자마의 작품 속에서 고삐 풀린 듯 뻗어가는 아이의 연상 작용이나 카니발의 흘러 넘치는 에너지를 포착하는 시선은 종종 밤을 몸을 억압하는 낮의 규율(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이 사라지는 아찔한 자유와 무질서의 시간이라 전제해요. 드자마의 생명체들이 우아함과 천박함, 생기와 폭력, 자연스러움과 야함 사이를 마치 그런 구별에 무지한 듯 거침없이 오가는 모습은 상식적인 어른들의 위를 실제로 뻣뻣하게 만들죠.

직접 만들거나 수집한 가면들 가운데에 선 마르셀 드자마 (출처: 뉴욕타임즈)

(왼쪽, 오른쪽) 안젤라 카터의 소설 『서커스의 밤』; 단편 영화 『광대의 춤』의 한 장면, 마르셀 드자마, 2013 (출처: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 유튜브)
하지만 동시에 밤은 낮의 고요(그런 순간이 있긴 하다면)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고요함이 새로운 질서가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낮 동안 다섯 감각들을 끊임없이 찔러대는 자극이 잦아드는 정화의 시간이면서 그런 혼란을 다스릴 수 있는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래서 밤은 아이러니하게도 낮보다 더 강력한 질서가 생기는 시간이기도 하죠.

(출처: Flickr)
드자마는 주로 어둠이 무르익은 밤에 작업을 한다고 해요. 와이파이가 없고 심지어 전화 신호도 미약한 드자마의 작업실은 그가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과 밀려드는 (대개 암울한 내용의) 뉴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의 작품에 대형을 이루어 춤을 추는 무용수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낮의 혼란에 나름의 “질서”를 부여해 보려는 시도였다고 해요. ‘안무’가 ‘몸짓’과 다른 점은 몸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에너지가 연출이란 거름망을 거쳐 표출되는 데에 있어요. 즉흥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듯한 드자마의 캔버스에서 희한하게도 어떤 무게 추가 느껴지는 건 드자마가 그만큼 면밀한 안무가라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드자마의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섬세한 선과 색채에서 뜻밖에도 야무진 조직감을 느꼈던 건 드자마를 이끄는 밤의 단순하고 촘촘한 질서가 제게 와닿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작업 중인 드자마 (출처: Art21)
죽음의 전령으로 읽히는 동물들이나 잘린 머리, 총과 화살 같은 폭력의 이미지가 드자마의 작품에서 그저 비릿한 핏빛 자극으로 다가오지 않는 까닭도 그 파괴적 에너지가 밤의 구조를 따라 보는 이들에게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드자마는 폭력과 상상력의 꿈틀거림을 머릿속부터 손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첨예하게 느끼는 남다른 감각을 지녔어요. 낮의 여과 없는 자극들은 그의 기민한 공감 능력과 감성이 소화하기 어려운, 어떤 과잉일 거고요. 그래서 드자마는 밤에 이끌리는 거겠죠. 자유롭지만 낮의 과열된 움직임처럼 그 속도와 양에 다른 존재들이 압살당하지는 않는 시간. 모두에게 평등한 고요가 무게 중심이 되는 시간. 그 어떤 무분별한 에너지도 조화로운 질서의 한 부분으로 정화될 수 있는 시간.
쑥스럽고 예민하기에 낮의 벌건 폭력을, 밤의 아뜩한 유희를 자유롭지만 흘러 넘치지 않는 군무로 정렬해 낼 수 있는 드자마. 그 또한 자신이 이끌리는 고요한 질서에 소속된, 섬세한 밤의 생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