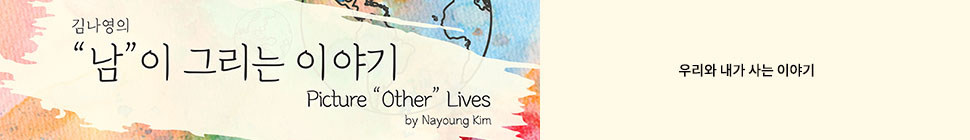무대 조명 끄기, 무대 조명 켜기, 스테파니 시후코(Stephanie Syjuco)
-
138회 연결
-
- 관련링크 : https://prismaticreader.com/132회 연결
본문
“어이, 중국 아가씨(China doll).”
3년 전 여름, 미국 서부에 있는 몬태나 주(Montana)로 다녀왔던 로드 트립 중 누군가 저를 불렀던 말이예요.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서부는 며칠을 달려도 끝없이 평평한 들판, 잠시 숨이 막힐 정도로 거대한 산과 골짜기, 그리고 제 피부색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공간이었어요. 제 배우자와 함께 했던 그 여행의 목적지는 몬태나에 사는 배우자 가족과 친척의 집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푸른 눈이 참 따뜻했던, 배우자의 고모 할머니가 저와의 첫 만남 이후 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대요.
“도자기 인형(porcelain doll) 같이 예쁜 아가씨네.”
(왼쪽, 오른쪽)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몬태나 주 어느 주유소 앞; 몬태나 주 경계 안내 표지판
(사진 출처: 김나영, 위키미디어)
몬태나는 지금도 주민의 약 80퍼센트 이상이 백인일 정도로 유색 인종 인구 비율이 낮은 주예요. 비백인 인구 중 아시안은 1퍼센트 미만이고요. 그 중 저처럼 아시안이면서 미국인이 아닌 주민은 더욱 적죠. 몬태나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젊은 아시안 여자’나 ‘핫한 외국인 여자’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 아가씨”하고 그 역할을 소리 내어 읽었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그걸 의식적으로 읽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그룹 사람들이 공유했던 건 ‘이국적 아시안 여자’란 역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고요. 전 그 역할이 불편했지만, 그걸 대신할 다른 역할을 내세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다른 역할도 나라는 사람의 특질 중 일부를 강조하는 ‘역할’일 테니까 여전히 ‘나’를 오롯이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무대 조명을 쏘듯 저의 겉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돌출했던 그 공간에서, 저는 흐릿해지길 바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티스트 스테파니 시후코(Stephanie Syjuco)는 미국이란 공간이 어떤 무대를 만들어 내고, 그 무대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지 섬세하게 다뤄요. ‘진짜’ 미국인 관객들(역사적으로 백인, 남성, 이성애, 기독교와 묶여왔던)이 어둠 속에 편안히 몸을 숨기고 관람하는 무대에 ‘아시안’이나 ‘불법체류자’ 같은 역할을 배정 받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시후코는 이 배우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찾아주는 대신 이들에게 쏘이던 눈 시린 무대 조명을 끄는 방법을 택해요. 배우의 얼굴 주름과 팔다리 근육의 굴곡까지 관객에게 노출하는 조명이 꺼질 때, 무대에 선 사람은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가 아닌 그냥 ‘어떤 사람’이 돼요. 관객의 눈이 어둠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 사람의 실루엣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어둠 때문에 피부색이 무엇이고 머리카락이 곱슬거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완전한 투명 필터 (N의 초상)』 (Total Transparency Filter (Portrait of N)), 2017, 스테파니 시후코 (출처: 스테파니 시후코 Flickr)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투명한 배경을 의미하는 흰색과 회색의 체커보드 무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음’을 눈에 보이게 표시하는 기호라니, 아이러니하죠. 『완전한 투명 필터 (N의 초상)』에서 초상의 주인공을 덮고 있는 이 체커보드는 이 사람 역시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바로 그 체커보드가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덕분에 천 뒤에 누군가 ‘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나죠. 어둠 혹은 암전이 무대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음’이란 표시지만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의 작은 움직임을 오히려 더 예민하게 느끼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요.
체커보드 혹은 무대 위 어둠에 쌓인 N에 대해 저에게 주어진 정보는 그가 여기 있다는 사실과 이름의 이니셜 N이 전부예요. N은 무작위로 고른 알파벳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 졌어요.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는 이름은 무엇인지. 당신은 왜 여기에 앉아있기로 했는지.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왜 당신의 선명한 얼굴이 아니라 유령을 떠올리게 하는 흐릿한 형상으로 표시하고 싶었는지.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체커보드 대신 스튜디오 조명이 N의 얼굴을 제 눈에 노출시켰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한 투명 필터』의 주인공은 미국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않은, 이른바 ‘불법체류자’, 미기록 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예요.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국에 알려지는 순간 추방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있지만 없는 사람이고, 없어야 안전한 사람이면서도,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은 ‘불법체류자’인 N에게 ‘법적 시민’인 제가 던지는 것이예요.
‘어떤 사람’ N에게 건넸던, 그의 삶은 어떤 색인지 묻는 평범하고 단단한 질문과는 다른, 동정이 애매하게 섞인, 일방적으로 던지는 모호한 공감.
시후코는 오직 특정한 사람들만 배우로 만드는 스팟 조명을 끄는 한편, 진실이라 여겨지는 까닭에 좀처럼 무대에 올려지지 않는 정체성을 역할로 만들고 거기에 무대 조명을 일부러 비추기도 해요. 이를테면 ‘미국성’의 중요한 근원 중 하나라 여겨지는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가 무대 위에 올려지는 거죠.
 『가시적 비 가시』 (The Visible Invisible), 2018, 스테파니 시후코 (출처: 스테파니 시후코 Flickr)
『가시적 비 가시』 (The Visible Invisible), 2018, 스테파니 시후코 (출처: 스테파니 시후코 Flickr)
팬데믹 줌 회의 때 한창 유행했던 ‘그린 스크린’ 기억하세요? 위에 원하는 배경을 덧입힐 수 있는, ‘없는’ 바탕이요. 체커보드의 영상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가시적 비 가시』는 소위 ‘크로마키 녹색(chromakey green)’이라 불리는 이 짙은 녹색의 의상을 입은 마네킹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왼쪽에 선 마네킹의 의상은 ‘뉴잉글랜드 청교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보여주고요. 철저한 고증을 거쳐야 하는 역사 박물관에서 볼 법한 전시물로 보이기도 해요. 안 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볼 수가 없는 저 녹색만 아니었다면 말이예요.
크로마키 녹색은 배경에 녹아 들어야 하는 색(invisible green), 곧 보이지 않아야 하는 색이예요. 그 위에 아래처럼 ‘진짜’ 미국인의 모습이 덧입혀지는 ‘없는’ 색이어야 하죠.
『물병을 든 소녀, 여름 한 때』 (Girl with Pitchers, Summer Scene), 1883-1887, G.H. 보튼 (G.H. Boughton) (출처: Art UK)
시후코는 ‘없는’ 녹색에 표면을 닳게 만들 것 같은 강렬한 조명을 쏘아요. 보튼의 그림 속 소녀처럼 자연스러운 진짜 미국인의 모습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투명한 녹색에 덧씌운 허구라는 걸, ‘진짜 미국인’ 역시 ‘불법체류자’처럼 조작된 역할이라는 걸 보지 않을 수 없도록요. 시후코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쾌해서 그걸 관객에게 전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더라고요.
크로마키 녹색을 쓰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던지 마네킹의 의상이 역사 고증과는 동떨어진, 문자 그대로 무대 의상이란 사실도 시후코는 굳이 알려주거든요.
시후코가 마네킹의 의상을 만들기 위해 참조한 무대 의상 도안집 (출처: 스테파니 시후코 Flickr)
“이거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이거 가짜예요. 진짜 아니예요!”
그 자체로 없다고 외치는 녹색도 모자라 역사에 없는 시대 의상이라고 친절히 짚어주다니,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건 시후코가 조작해야 하는 무대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 무대의 관객을 설득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국적 중국 아가씨’가 가짜인 역할이라는 것만큼 어떤 ‘역사적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건 뻔한 건 같지만 뻔하지 않은 일인가 봐요.
1904년 미국 미주리(Missouri) 주 세인트 루이스(St. Louis)에서 최신 과학 기술과 고전 문화, 그리고 세계의 ‘진귀한’ 구경 거리들이 전시된 세계 박람회(World’s Fair)가 열린 적이 있어요. 눈요기거리 중 하나는 세계 각 지역의 원주민과 원주민 마을을 옮겨 놓은 이른바 인간 동물원이었는데 막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필리핀의 ‘원주민’도 그 중 하나였죠. 시후코는 미주리 지역 박물관 기록 보관소들에서 찾은 세계 박람회 이미지에 노출된 필리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손으로 가려요. 이들을 ‘비백인 원주민’으로 만드는 조명을 천천히, 전부 끄기 위해서요.
무대 조명을 끄고 켜는 일은 손을 쓰는 노동(manual labor)이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지 스위치를 누르는 일이니까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내는 일보다 소극적이고 손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양 가리기』에서 보이는 시후코의 무수한 손들이 암시하듯 그렇게 가리고 비춰야 하는 배우와 역할이 한 두 개가 아니라 박물관의 기록 보관소를 채울 만큼 많다면 조명을 켜고 끄는 시후코의 노동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때로는 따가운 조명으로도 관객들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아서 ‘이곳은 무대고 지금 눈에 보이는 빛은 자연광이 아니라 인공 조명입니다’라고 주석까지 매달아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몬태나의 건조한 조명을 피해 희미해지고 싶었던 건 참 무른 바람이었구나, 생각한 적이 있어요. 조명 빛에 노출된 채 어쩌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상태. 늘 조용한 의지가 감도는 시후코의 작품에서 때로 고달픔이 느껴지는 건 가냘픈 바람이나 얕은 인내심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무대 뒤의 노동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