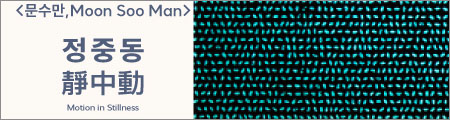위로
본문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 만나는 맛을 잃어버렸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쉴 새 없이 늘어놓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이즈음 야탑에서 공방 일을 하던 목수를 만나면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다. 건축학과를 나와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그는 말수가 적었다. 묻는 말에 그저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다.
우리는 주로 싱글족이 40%를 넘어서는 시대에 사회문화적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았다. 초미니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일테면 작은 평수의 집에 맞게 가구를 비롯해서 모든 생활용품이 작으면서도 아기자기한 것으로 탈바꿈하는 건 물론 슬리퍼 신고 그때그때 필요한 적은 양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작은 각종 상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설 것이란 게 그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목수는 말이 없었다. 허공만을 바라보다가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그날은 헤어졌다. 며칠 뒤 다시 만난 그는 활기차 보였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묻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대신 나에게 뜬금없이 사는 게 재미있느냐고 물었다. 며칠 전 만났을 때 내 모습에서 삶에 많이 지쳐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내가 했던 말 이면에서 그런 것들이 풍겨왔다는 것이다.
나는 적잖이 놀랐다.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는 태도 이면의 감성적 상태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감정을 들킨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있는 그가 고맙게 느껴졌다. 이런 경험은 실로 오랫만의 일이었다.
어찌보면 그나 나나 사는 게 고단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 지쳐있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대상도 없는 현실이다.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봉건압제 속에서도 민초들을 위로해준 당시의 지리산 쌍계사 같은 고즈넉한 사찰이 부럽기만 할뿐이다.
이런 속에서 목수의 나에 대한 관심은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인간에 대한 진정한 위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목수의 손을 잡으며 언제 막걸리 한 잔 사겠다고 빈말을 했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