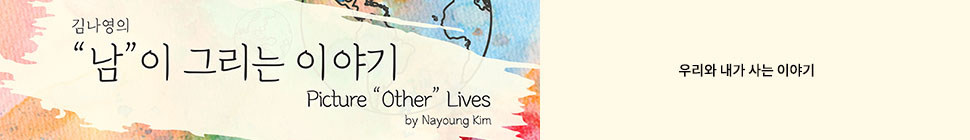오만과 반항: 잉카 쇼니바레 CBE RA (Yinka Shonibare CBE RA)
-
150회 연결
-
- 관련링크 : https://prismaticreader.com169회 연결
본문

나와 내 문화에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의 문화에 매혹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한때 대일본 제국이었던 나라의 단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다도 문화나 ‘초강대국’ 미국의 ‘쿨한 애티튜드’가 떠오르네요.
내 문화를 짓밟고 자기 것을 이식하려 했던 이들의 문화, 그들의 (오만에 가까운) 자기 확신, 물리적 부유함과 자기 확신이 모호하게 뒤섞인 데에서 나오는 그들 문화의 ‘아름다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 문화에 이끌리는 이상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영어권 문학, 특히 유럽-북아메리카권에서 주로 읽히는 문학을 전공했어요. 피지배 문화권 출신 외국인이기에 영어라는 언어가 달고 오는 군사, 문화 제국주의란 모래주머니를 땀을 삐질 삐질 흘리며 끌고 가야 하는데도 그들의 이야기에 도취되곤 했어요.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같은 책을 어디든 들고 다닐 만큼요.
기이하죠.
우리는 정확히 무엇에 매료되는 걸까요?
그들 문화의 객관적 ‘아름다움’일까요?
아니면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권력과 자기 확신일까요?
나이지리아 계 영국 작가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의 이름 뒤에는 “CBE RA”란 칭호가 붙어있습니다. “Command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영국 왕실에서 ‘대영 제국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에게 수여하는 명예 작위 중 하나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극작가 해롤드 핀터,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휴 로리 등 걸출한 사람들이 줄지어 있죠. 쇼니바레는 40여 년 간 이어온 작품 활동 기간 중 제국의 작위를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쇼니바레가 ‘대영 제국의 위상’을 어떻게 드높였는지 본다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예요.

(왼쪽, 오른쪽) 『아프리카 쟁탈전』 (Scramble for Africa), 2003; 『그네 (프라고나드를 따라)』 (The Swing (after Fragonard)), 2001
(이미지 출처: 잉카 쇼니바레 웹사이트)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를 통해 대영 제국에 넘쳐 흘러들었던 찬란한 과도함, 대저택 응접실에서 풍기는 숨막히게 짙은 향수 냄새, 제국의 부를 뒷받침했던 시꺼먼 자원 수탈, 이제 아프리카인들을 포함한 모두가 가장 아프리카적인 패턴 직물이라 여기는 더치 왁스 코튼(Dutch wax cotton)이 품고 있는 얄팍하고 폭력적인 역사.
쇼니바레가 대영 제국의 영광에 예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제 작업이 늘 제국에 대한 비평이었던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죠.” 2004년 MBE (Memb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작위를 받고 난 후 쇼니바레는 한 인터뷰에서 장난기 어린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그저 제국의 어이없는 행보에 대한 가벼운 냉소로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한편으로는 좀 으쓱해요.” 다른 인터뷰에서 쇼니바레는 말했습니다. 작가는 ‘제도권은 예술가들의 작업에 별 관심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닌 듯해요.
그건 쇼니바레가 심미적 아름다움과 함께 (어쩌면 그보다 더) 권력과 부에 매료되기 때문이예요.
나이지리아에서 부유하고 사회적 권위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그 누구에도 주눅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쇼니바레는 영국과 미국에서 작동하는 인종 위계를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19살 때 척추 감염으로 인해 전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얻었던 경험은 사회적 특권에 기대고 있었던 그의 자존감을 뒤흔들었죠. 과거 대영제국 식민지 출신 엘리트 아프리카인이면서 장애인인 쇼니바레가 ‘명망 높은’ 영국 예술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권력에 대해 느꼈던 불편함은 그의 작품 세계에 은근한 미소를 머금은 반항을 드리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쇼니바레의 작품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권력에 대한 반항만큼이나 강렬한 건 그에 대한 이끌림이예요. 그건 나를 이등 시민이라 규정하는 저 권력이 만들어낸 예술에 대한 끌림이면서 저 권력 자체에 대한 욕망일 테죠. 쇼니바레는 자신의 작품이 “나 자신과 ‘과도함(excess)’의 관계”에 대한 탐구라고 말했어요.




작품 속 색채와 패턴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보는 사람을 긴장시켰던, 힘에 대한 갈망이 얼마간 부드럽게 누그러졌다고 할까요. 이전 작품은 쇼니바레 자신의 “허영(vanity)”과 권력에 대한 불편한 매료가 추동했어요.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인종 사이, 국가 사이의 위계에 지극히 날카롭고 민감했던 젊은 쇼니바레가 『아프리카 새의 마력 (세이커매) Ⅰ』에 보이는 원주민 가면처럼 ‘전형적’인 아프리카 흑인의 얼굴을 작품에 들여오기는 아마도 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요.
원숙한 작가가 된 지금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를테면 젊은 무명 작가들, 종 생존이 위협받는 아프리카의 새)의 미래와 갈망을 응시하는 너그러움이 쇼니바레를 움직이는 듯해요. 힘의 질서에 대한 상반된 온도가 젊은 쇼니바레를 웃음 띤 곡예사 같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했다면, 지금은 그러한 이중적 상태 자체로부터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인종적 모호함”을 유지해야 했던 과거에는 마네킹의 얼굴이 늘 비어 있었죠. 그리고 빈 공간은 잠시 숨을 멎게 하는 팽팽함을 만들어 냈고요. 하지만 최근 마네킹 작품들은 아프리카 가면, 유리로 된 지구본, 동물의 머리 등 갖가지 얼굴을 보여주면서 어떤 가벼움과 여백이 있는 관용을 전달해요.
과거에 쓰지 못했던 전형적 이미지를 선뜻 쓸 수 있다는 건 쇼니바레가 오만한 소유욕과 정의로운 반항을 양팔에 끌어안았던 까닭에 겪고 표출해야 했던 치열하고, 진지하고, 괴로운 유희에서 조금은 벗어났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의 작품을 보는 사람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쇼니바레가 찾은 고요함이 기쁘게 느껴지네요.